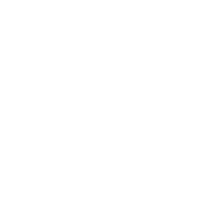“웃고 떠들며 성폭력 이겨내요"
안티성폭력 페스티벌, 상영작은 이경순 감독의 <잃어버린 것들>… 끔찍하게 뺏긴 운동장과 골목 비추며 매스컴 밖 성폭력 보여줘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대’는 한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균형을 찾기 위한 반대다. 미스코리아로 상징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에 반기를 들었던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 이어 또 하나의 안티페스티벌이 지난해 6월 첫 판을 선보였다. 한반도, 아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이 그것이다.
‘안티’로 세균 퇴치 나선 두번째 축제
1회 페스티벌은 ‘포르노 포르나’(porNO porNA)를 내걸었다. 남성 중심의 폭력적 성문화인 ‘포르노’ 대신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입으로 말하는 성문화 ‘포르나’를 외쳤다. 유영철 사건, 밀양 고교생 성폭행 사건 등 이 땅의 비뚤어진 성문화에 애도를 표하며 웃음과 눈물로 신나는 판을 벌였더랬다.
1회 페스티벌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암세포보다 더 끈질기고 관절염보다 더 지긋지긋한 이 성폭력이라는 세균은 올해에도 역시 우리 사회를 갉아먹었다. 2006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성폭력’이었다.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 교도관의 여자 재소자 성폭행 사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서로 짜기라도 한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 일어났고 4월에는 연쇄 성폭행 범인 마포 ‘발바리’가 잡혔다. 물론 이렇게 굵직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신문지면을 지저분하게 수놓았다.
그러나 이 땅의 언니들은 모두 알고 있다. 방송을 타는 성폭력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폭력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몸통은 일상의 성폭력이다. 곳곳에 퍼진 이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 언니, 오빠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6월2일 홍익대 체육관에서 열린 2회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은 ‘성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성폭력 추방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바바리맨’을 퇴치하는 ‘퇴바사’들의 퍼포먼스와 즉흥춤 ‘마구’, 여성과학기술인팀이 보여주는 패러디극 ‘황자매의 꿈’, 54살의 살사댄서 백영애씨의 환상적인 춤 등이 펼쳐졌다. 페스티벌 본행사가 끝난 뒤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밤길을 환하게 밝히며 성폭력 반대를 알리는 거리행진에 나섰다. 그중에는 의문사를 다룬 <민들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어 가족 문제에 카메라를 들이댄 <쇼킹 패밀리>로 전주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의 이경순 감독도 있었다.
이 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성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것들>을 상영했다. 여성들의 육성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일상의 성폭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과 잃어버린 공간에 대해 얘기한다. 다큐멘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성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된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낯선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여성의 목소리는 성폭력이 무엇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보여준다.
아, 나도 당할 수 있구나!
이 감독은 “대한민국 여성은 모두 성폭력 생존자”라고 말했다.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여성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성폭력의 상처 이면에는 그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골목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골목길이 두려워지죠. 그렇게 성폭력 피해여성은 공간을 잃어버려요.”
운동장을 비추던 카메라는 이어 안티성폭력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인 도서출판 ‘이프’ 엄을순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국대 유지나 교수, 개그우먼 안영미씨,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등에게 다가간다. ‘공인’인 이들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성폭력 생존자로서의 기억을 꺼내놓는다. 어린 시절 낯선 아저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던 일, 학교 앞에서 본 바바리맨의 성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을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진다.
이들이 꺼내놓은 기억과 경험의 무게는 다른 모든 생존자의 기억과 경험의 무게와 같다. 지하철이나 심야 좌석버스, 밤 골목길, 학교 정문 앞, 운동장은 이 땅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잃어버린 공간이다. 스멀스멀 몸을 향해 다가오는 손이나 생물 시간 교과서 그림을 복습이라도 해주려는 듯 들이대는 남성 성기, 술자리에서 느꼈던 모욕감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교집합이다. 이들의 기억과 경험은 말과 표정으로 화면을 지나 보는 이들과 눈을 맞춘다.
다큐멘터리에 담지는 않았자만 이 감독 역시 성폭력 생존자다. 몇 년 전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가려는데 청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뒤쪽에서 손으로 이 감독의 입을 막고 팔을 꺾어서 끌고 가려고 했다. 평소 홍콩 영화를 많이 봐온 덕에 발로 정강이를 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씩씩한 이 감독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이물질을 심어줬다. 이 감독은 “‘나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 사건 이후 나 역시 한동안 밤에 골목길을 걸어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이번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여성들의 얘기를 듣고 촬영하면서 ‘성폭력은 모두의 얘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했던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언급하며 ‘상처 드러내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큰 사건들만 보도가 되니까 다른 성폭력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범죄 차원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덮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감춰두거나 아픈 얘기만 하기보다 이렇게 축제처럼 함께 웃고 떠들고 드러내면서 이겨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안티 성폭력, 판을 키우고 싶다
9년 동안 발간된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와 6년 동안 진행된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밖을 향해 얘기하기와 웃음과 눈물로 시원하게 흘러 내보내기, 손을 모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가 남성 중심적인 폭력에 맞서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가르쳐줬다. 그래서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이 성폭력 추방에도 큰 구실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폭력상담소 등 기관과 현장활동가, 안티성폭력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더 내실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판이 커지면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물론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처럼 신나고 활기차게 말이에요.”
안티성폭력 페스티벌, 상영작은 이경순 감독의 <잃어버린 것들>… 끔찍하게 뺏긴 운동장과 골목 비추며 매스컴 밖 성폭력 보여줘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대’는 한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균형을 찾기 위한 반대다. 미스코리아로 상징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에 반기를 들었던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 이어 또 하나의 안티페스티벌이 지난해 6월 첫 판을 선보였다. 한반도, 아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이 그것이다.
‘안티’로 세균 퇴치 나선 두번째 축제
1회 페스티벌은 ‘포르노 포르나’(porNO porNA)를 내걸었다. 남성 중심의 폭력적 성문화인 ‘포르노’ 대신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입으로 말하는 성문화 ‘포르나’를 외쳤다. 유영철 사건, 밀양 고교생 성폭행 사건 등 이 땅의 비뚤어진 성문화에 애도를 표하며 웃음과 눈물로 신나는 판을 벌였더랬다.
1회 페스티벌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암세포보다 더 끈질기고 관절염보다 더 지긋지긋한 이 성폭력이라는 세균은 올해에도 역시 우리 사회를 갉아먹었다. 2006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성폭력’이었다.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 교도관의 여자 재소자 성폭행 사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서로 짜기라도 한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 일어났고 4월에는 연쇄 성폭행 범인 마포 ‘발바리’가 잡혔다. 물론 이렇게 굵직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신문지면을 지저분하게 수놓았다.
그러나 이 땅의 언니들은 모두 알고 있다. 방송을 타는 성폭력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폭력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몸통은 일상의 성폭력이다. 곳곳에 퍼진 이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 언니, 오빠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6월2일 홍익대 체육관에서 열린 2회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은 ‘성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성폭력 추방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바바리맨’을 퇴치하는 ‘퇴바사’들의 퍼포먼스와 즉흥춤 ‘마구’, 여성과학기술인팀이 보여주는 패러디극 ‘황자매의 꿈’, 54살의 살사댄서 백영애씨의 환상적인 춤 등이 펼쳐졌다. 페스티벌 본행사가 끝난 뒤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밤길을 환하게 밝히며 성폭력 반대를 알리는 거리행진에 나섰다. 그중에는 의문사를 다룬 <민들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어 가족 문제에 카메라를 들이댄 <쇼킹 패밀리>로 전주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의 이경순 감독도 있었다.
이 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성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것들>을 상영했다. 여성들의 육성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일상의 성폭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과 잃어버린 공간에 대해 얘기한다. 다큐멘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성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된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낯선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여성의 목소리는 성폭력이 무엇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보여준다.
아, 나도 당할 수 있구나!
이 감독은 “대한민국 여성은 모두 성폭력 생존자”라고 말했다.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여성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성폭력의 상처 이면에는 그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골목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골목길이 두려워지죠. 그렇게 성폭력 피해여성은 공간을 잃어버려요.”
운동장을 비추던 카메라는 이어 안티성폭력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인 도서출판 ‘이프’ 엄을순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국대 유지나 교수, 개그우먼 안영미씨,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등에게 다가간다. ‘공인’인 이들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성폭력 생존자로서의 기억을 꺼내놓는다. 어린 시절 낯선 아저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던 일, 학교 앞에서 본 바바리맨의 성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을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진다.
이들이 꺼내놓은 기억과 경험의 무게는 다른 모든 생존자의 기억과 경험의 무게와 같다. 지하철이나 심야 좌석버스, 밤 골목길, 학교 정문 앞, 운동장은 이 땅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잃어버린 공간이다. 스멀스멀 몸을 향해 다가오는 손이나 생물 시간 교과서 그림을 복습이라도 해주려는 듯 들이대는 남성 성기, 술자리에서 느꼈던 모욕감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교집합이다. 이들의 기억과 경험은 말과 표정으로 화면을 지나 보는 이들과 눈을 맞춘다.
다큐멘터리에 담지는 않았자만 이 감독 역시 성폭력 생존자다. 몇 년 전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가려는데 청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뒤쪽에서 손으로 이 감독의 입을 막고 팔을 꺾어서 끌고 가려고 했다. 평소 홍콩 영화를 많이 봐온 덕에 발로 정강이를 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씩씩한 이 감독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이물질을 심어줬다. 이 감독은 “‘나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 사건 이후 나 역시 한동안 밤에 골목길을 걸어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이번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여성들의 얘기를 듣고 촬영하면서 ‘성폭력은 모두의 얘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했던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언급하며 ‘상처 드러내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큰 사건들만 보도가 되니까 다른 성폭력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범죄 차원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덮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감춰두거나 아픈 얘기만 하기보다 이렇게 축제처럼 함께 웃고 떠들고 드러내면서 이겨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안티 성폭력, 판을 키우고 싶다
9년 동안 발간된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와 6년 동안 진행된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밖을 향해 얘기하기와 웃음과 눈물로 시원하게 흘러 내보내기, 손을 모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가 남성 중심적인 폭력에 맞서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가르쳐줬다. 그래서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이 성폭력 추방에도 큰 구실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폭력상담소 등 기관과 현장활동가, 안티성폭력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더 내실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판이 커지면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물론 안티성폭력 페스티벌처럼 신나고 활기차게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