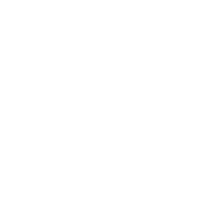"차별금지법, 고용차별 개선 실효성 낮을 수도"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의견 발표회…노동계, 근로자 개념 '좁은 해석' 우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차별 금지, 시정명령권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 이번 권고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차별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입법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고용상 차별문제는 노동관련 전문가조차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입법안이)노동법상 근로자 개념마저 편향된 관점에서 확대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사안도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이 노동위원회 내 차별시정기구를 규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중복해 다루는 것은 판정결과의 불일치 등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발하는 의견 발표회가 10일 열렸다. 사회학, 여성학, 법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차별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발표회에 토론자로 나온 김진 변호사(민변)는 경영계가 특히 반발하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해 “경영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모든 면에서 다르다면, ‘차별 금지 영역’에 포함된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근로자 개념' 좁은 해석 우려"
인권위 권고법안 제4조11항에는 근로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인권위는 근로자 정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실상의 근로자 개념을 추가하여 보완했다”고 의미를 밝힌 상태다.
김진 변호사는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인권위법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여 노동법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서 ‘차별 금지’ 부분이 매우 쉽게 넘어간 부분 중 하나”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원래 다르다’는 입장이 고려돼 비정규법에서 비교적 쉽게 ‘차별금지’ 부분이 넘어갈 수 있었다”며 “인권위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정규직과 비장규직 사이의 ‘같음’을 측정하고 증명할 수단이나 정교한 직무평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노동계는 인권위법의 제4조 제7호의 ‘고용형태 정의’(통상근로와 통상근로가 아닌 근로로 구분)와 관련해 “통상근로형태의 특수고용(또는 간접고용)과 기간제인 특수고용(또는 간접고용)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한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성 탓하기는 소모적 논쟁"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경영계가 지적한 ‘인권위의 고용판단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정형옥 노무사((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인권위 출범 이후 2005년 말까지 접수된 총 2,017건의 진정사건 중 48%에 달하는 961건이 고용차별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며 “다만 인권위가 노동위원회와 같은 ‘고용과 노사관계의 전문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인권위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