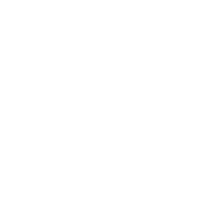[논평]
노동 없는 동반성장, 의지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 이명박 정권의 최대 패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공정사회론’이다. 친기업과 노동탄압에 혈안인 편파적인 정부가 ‘공정론’을 꺼내든 것부터가 실소를 자아냈고, 실제 그에 따른 정책추진도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결국 ‘공정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으며,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더 키웠을 뿐이다.
한 때 정부는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주문했지만 시늉만 낸 ‘공정’일뿐이었다. 삼성은 중소기업이 자립하지 않고 대기업에 의지해서는 안 되다며, 상생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자격을 시비하는 등 즉각 반발했는가 하면, 개념도 ‘상생’이 아닌 ‘동반성장’으로 명명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상생’은 시장을 독점하여 성장을 주도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성장논리에 기초한 ‘동반성장’으로 둔갑했다. 이에 따라 어제(13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모양새는 초라했고 내용 역시 불신만 자초할 것들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현하겠다는 기업 간의 공정과 상생은 말뿐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에 앞서 총리가 위촉한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고발하며 사퇴했는가 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설치의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정부 역시 생색만 낼 뿐 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지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의 한결 같은 일성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왜곡과 파행을 예고했다. 그들은 생뚱맞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만을 강변했고, 초대위원장인 정운찬 전 총리 역시 “기업 발목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 일률적인 나눠먹기는 곤란하다. 대기업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며 한심한 맞장구를 쳤다. 무엇보다 지적해야 할 점은 철저히 ‘노동을 배제한 공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을 공정사회의 구성원으로도 경제의 주체로도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은 기업 간의 문제일 뿐이며, 노동은 기업에 종속된 소모품이고 유연화 시켜야 할 수단에 불과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 쉽,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중소기업의 기업역량 확보, 하도급 윤리준수 등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헌장’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건데 진정한 공정사회의 실현은 기업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사의 불균형, 즉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와 지나친 노동유연화를 간과하고선 가능할 수 없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곧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도 포함됐다. 그리고 오늘부터 현대차와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의 본교섭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교섭이 바로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현대차는 성실하고도 책임 있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201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