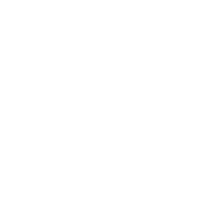[논평]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난센스, 대법판결 후퇴이자 정치탄압 발상
-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한 법치, 지배집단에 복구하는 법원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1년 3월 17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처럼 사실상 대법의 최고 심판절차로서 하급심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어제 대법원의 소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따른 고법의 판결 모두를 사실상 뒤집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2009년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자체로 법리와 사법체계에 반하는 후퇴된 판결이자 판결의 취지를 볼 때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재판부는 공공기관선진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대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전제 한 후,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업무방해죄 적용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제적 상식으로 볼 때 정치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노조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단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사용자측은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파업대책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의도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정치적 판결로서 부당하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헌법 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자체가 원천봉쇄 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의 정신과 노사관계의 대립성을 봤을 때 파업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제한해선 안 된다. 2011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5명의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일방의 채무이행(노동)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업무방해죄 적용 논리가 강제노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과거 전쟁준비에 골몰하던 일본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으로, 일본에서조차 폐기처분된 법리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따라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법원이 본질적으로 지배집단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편파적이고 보수집단임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법 해석이나 적용도 헌법정신과 사회정의를 따르기 보단 점차 확대되는 자본권력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다. 법치는 권력집단의 횡포로부터 국민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결코 속박해선 안 된다.
2014. 8.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